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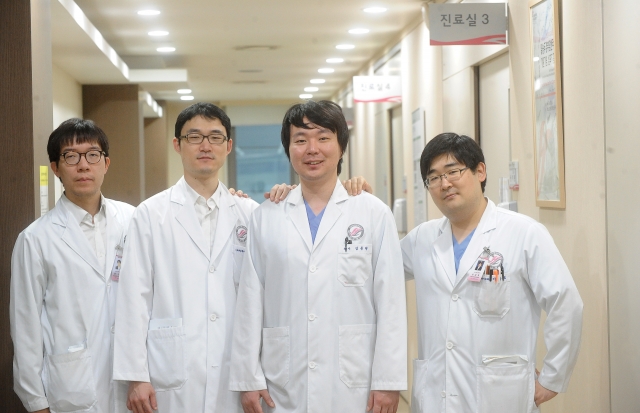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국생활을 하다보면 시간 개념 날짜 개념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청소는 무슨, 활동 반경 내 손닿는 곳만 치우고 사는 게 최선이라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간혹 의국들을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의국인지, 정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의국도 그랬다. 테이블 위에 모셔 놓은 술병도 벌써 3년째 자리하고 있단다. ‘언젠가 마셔주리’ 회심의 미소를 짓던 기억도 나이를 먹어 잊혀졌다고. 달리는(?) 것도 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니 ‘환자’라는 답이 돌아온다. 빨갛게 충혈 됐지만 자신감 넘치는 눈빛들을 한 1년차 김동현 선생, 2년차 박장희 선생, 3년차 김고운 선생, 4년차 백소혜·이상효 선생을 만나봤다. 아쉽게도 동탄성심병원에 파견 간 2년차 권오준 선생과 해외학회 참석 차 호주로 떠난 3년차 조범기 선생은 함께 자리하지 못했다.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이 무기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목구멍 1개를 합쳐 구멍 5개를 치료한다고 해서 ‘오공’과라 불리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을 꼽는다면 중환자가 없어 의국생활이 편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어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란다. 특히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는 두경부암 수술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의국장인 이상효 선생이 포문을 열었다.
“의국 특징이라면 주로 수술 시간이 긴 암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른 수련병원에서는 일 년에 몇 케이스 보기도 힘든 수술을 많이 보다보니 전문의 시험 볼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경험만큼 좋은 수련도 없지 않나요. 이비인후과 의국생활을 통해 얻은 자산이 바로 경험과 자신감이에요.”
힘들고 고되지만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어떤 환자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단다.
“상태가 나쁜 환자들을 수없이 보죠. 개업을 하고 나서 어떤 환자를 마주치더라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개원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급한 환자를 찾아 상급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환자들에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안다고 얘기를 하려면 자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 이비인후과 의국은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기까지 고된 수련을 거듭해야 했다는 2년차 박장희 선생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1년차 때 두경부암 수술을 하러 아침 8시 수술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간호사와 인사를 했는데 꼬박 24시간 걸린 수술이었거든요. 다음 날 간호사가 절 보더니 다른 수술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꽤 까다로운 수술이어서 성형외과는 물론 신경외과까지 협진을 했던 터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때 딱 2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간 기억이 나네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술이었지만 좋은 자양분이 됐죠.”
괴팍하다는 오해는 ‘금물’
환자들의 ‘오공’을 치료하려면 털털하던 성격도 자연스레 꼼꼼한 성격으로 변하게 마련이라고. 이 꼼꼼한 성격 때문에 괴팍하다는 오해도 간혹 있지만, 그것도 다 환자를 위해서란다. 이 선생이 오해라며 손사래를 쳤다.
“너무 작은 구멍을 보다보니 주변에서 성격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괴팍해진다고들 해요. 그런데 정말 오해에요. 중환자실 주치의를 할 때였는데, 안과 과장님이 저희더러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환자에게 죽을 줘야 하는데 밥을 줬다며 아랫년차를 나무랐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수술하는 길이 음식물이 들어가는 길이다보니 수술 부위 손상을 고려해 음식물 형태도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사들이 보면 굶기지 않았으면 됐지 죽을 주던, 밥을 주던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윗년차로 수련이 거듭될수록 꼼꼼함의 농도도 짙어진단다. 다들 그렇게 괴팍해진다마는 의국생활이 암탉이 품어주는 품처럼 포근할 때도 있다고 얘기한다.
“교수님들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인격 모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고를 쳐도 무난하게 넘어가 주시거든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 혼나기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수련받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반면 교수님들께 저희들이 잘해 드리지 못하니 죄송할 따름이죠.”
환자와의 이별도 특별하게
바쁜 일상 탓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손에 꼽는다고. 그래도 한 가지 전통은 꼭 지키려고 한단다. 이비인후과가 맡아 보던 환자가 ‘운명’을 달리하면 예를 갖추고 환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자는 의미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한풀이가 바로 그것이다. 박 선생의 설명이 이어졌다.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교수님이 뒤풀이 자리를 마련하세요. 처음엔 왜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풀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잔을 기울이며 환자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렇게 환자를 떠나보낸 게 여간 안타까우신지 ‘뭐가 부족했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추모도 하지만 환자를 보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환자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한 게 없는지 생각해 본다는 이비인후과 의국원들. 작은 실수도 환자에게 해가 갈까 까칠하고 괴팍해질 수밖에 없다지만 이 또한 내 환자에게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란다. 늘 환자가 먼저인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의국원들의 자신감에 찬 눈빛이 반짝 빛났다.

